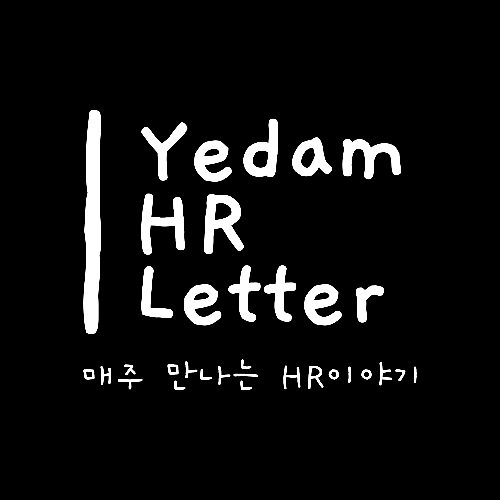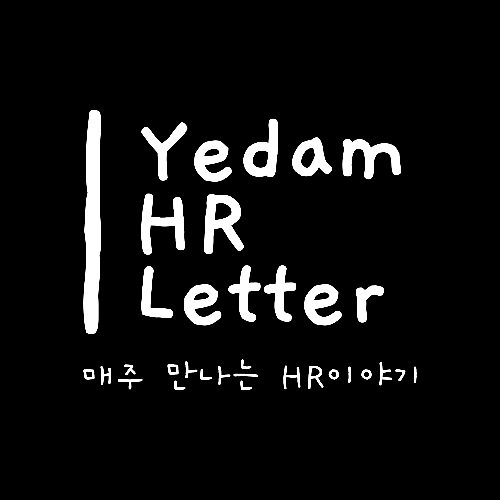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판결, 2023다302838판결)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를 전제로 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다. 즉,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재직조건’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재직조건’이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조건을 말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재직조건’을 통해 고정성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성을 관리해 왔다. 즉, ‘재직조건 부여 → 고정성 없음 → 통상임금 아님“이라는 논리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정기상여금 등 금액이 큰 임금의 경우 ’재직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재직조건‘을 부여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사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근로시간 패러다임에서 성과 패러다임으로 변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기업입장에서 통상임금 이슈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고 나아가 퇴직금이 증가하는 등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통상임금 이슈는 연장근로수당의 증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만약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면 어떨까? 통상임금 증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근로시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래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임금 이슈를 계기로 근로시간 패러다임에서 성과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책임(accountability)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무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말한다. 이제 기업은 직무의 성과책임을 규명하고 인식수준을 높이는 활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2. 고정OT제도 폐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고정O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정OT제도란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확대는 고정OT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고정OT수당으로 월 30만원(월10시간분, 시급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통상임금 확대로 통상시급이 3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월 45만원(월10시간분, 시급3만원)의 고정OT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더 이상 고정OT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정OT제도를 폐지하고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정OT폐지는 고정OT를 기본급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고정OT 폐지 시 단기적으로 기본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제도변화를 통해서 총액인건비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무·성과급 도입
이제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직무·성과급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직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사관리의 본질은 자발적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사(人事)관리에서 차이란 무엇일까? 차이는 사람(人)과 일(事)에서 발생한다. 사람의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과급이다. 그리고 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직무급이다. 이 두 가지 차이관리가 인사관리의 핵심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근속과 학력 등 연공에 기반한 연공급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연공급은 임금의 합리성이 낮을 뿐 아니라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무·성과급은 통상임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직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직무·성과급 도입은 통상임금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통상임금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통상임금 이슈가 HR을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쉽게도 또 다른 통상임금 회피방법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통상임금 회피 방법은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노동분쟁의 불씨만 남기게 될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히려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통상임금 이슈를 통하여 임금체계의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 임금은 구성원의 노력의 대가이며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의 수단이다. 임금의 본질에 맞게 임금체계를 변경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