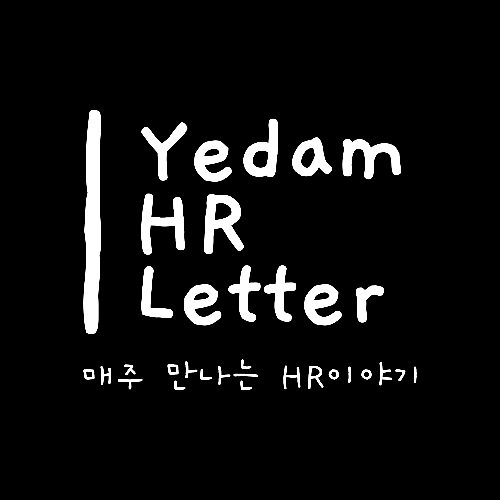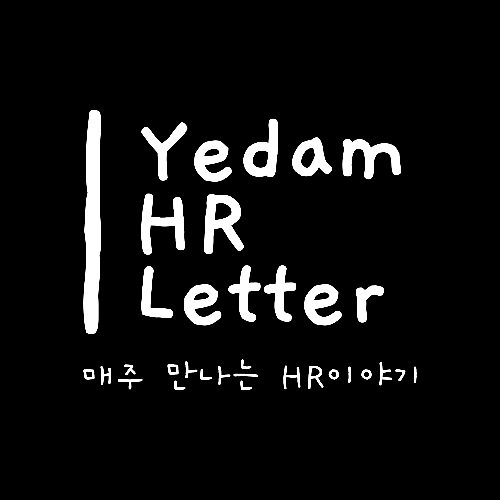Adam Smith는 이기심 기초한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평가일 뿐, 그는 인간 사회의 경제활동에만 관심을 가졌던 경제학자는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는 근대 시민 형성기에 인간과 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도덕 철학자였다. 그는 <국부론>저술 보다 7년 앞서서 <도덕 감정론>을 저술하였다. 그는 중세의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사적인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질서와 조화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선 선한 행위를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도덕 감각(moral sense)이 중요하다는 그의 스승 Hutcheson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fish)인 존재라고 해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몇가지 행동원리가 존재한다. (중략) 연민이나 동정심인데,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리사욕 추구 때문에 타인이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기심을 억제하게 된다."
그가 <도덕감정론>에서 그렸던 인간의 모습은 이기심이 있으나 그 이기심은 윤리적 행동의 범위내에서 통제되는 그런 모습이었지, 결코 자신만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주류경제학에 의해서 그의 생각이 왜곡되었을 뿐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에는 타인의 희로애락을 공평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가 존재하며,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제3자의 시각으로 상상하면서 관찰하여 그런 이기적 행동을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제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이것에 기초한 행동은 그 자체로 용납되지 않으며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주류경제학과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그려낸 인간의 모습은 사회라는 그물망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려고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영혼 없는 인간이었다. 사회를 허구적 실체로 보면서, 인간을 사회에서 고립된 원자로 보는 입장은 Adam Smith가 아니라 공리주의 창시자인 Jeremy Bentham에서 기원했고, 주류 경제학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덕 감정론>이 그려낸 인간의 모습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는 사회적 인간이었고, 자기이익 추구 행동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를 제3의 공평한 관찰자의 눈으로 판단하는 성찰하는 인간이었다. |